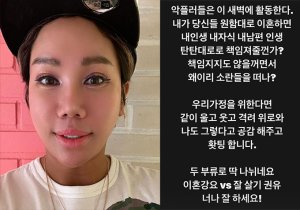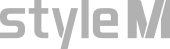한국에도 메시와 네이마르가 나올 수 있을까
[이현지의 컬티즘<85>] 위에서 만든 시스템보다 아래서부터의 지역 친화적 자생력이 먼저다
머니투데이 스타일M 이현지 칼럼니스트, | 2016.03.28 10:07 | 조회 11010
컬티즘(cultism). 문화(culture)+주의(ism)의 조어. 고급문화부터 B급문화까지 보고 듣고 맛보고 즐겨본 모든 것들에 대한 자의적 리뷰이자 사소한 의견.
 |
|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스틸컷/사진=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
갑자기 어벤져스와 FC 바르셀로나를 엮는 이유는 최근 관람한 경기 때문이다. 여러 일정이 겹쳐 겸사겸사 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운이 좋게도 UEFA 챔피언스 리그, 그것도 아스널과 FC바로셀로나의 16강전 경기를 볼 수 있었다. 엄청난 축구 팬은 아니지만 월드컵의 영향으로 좋아하게 된 메시와 네이마르가 소속된 FC바르셀로나의 경기를 직접 보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경기는 역시 명불허전. 전반 17분에 네이마르가, 후반 19분에 수아레즈가, 그리고 43분에 메시가 각각 골을 성공시키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결과도 결과지만 상대팀을 쥐락펴락하는 그 승리의 여정이 마치 영화 '어벤져스2'의 첫 장면에서 헐크, 아이언맨, 토르, 캡틴 아메리카가 함께 싸우는 장면을 보는 듯한 황홀한 기분마저 들었던 것이다.
바르셀로나의 전략은 간단하다. 칼 같이 정확한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팀의 한 곳으로 몰아 넣은 후 그 공간을 좁혔다 넓혔다 하는 과정을 반복 한다. 그 과정에서 상대팀의 체력이 소모되고 정신이 교란되는 순간 공격수가 순간적으로 그 원 안으로 공을 가지고 돌파하면서 골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누구라도 한 눈에 알 수 있지만 이 전략을 피하기란 쉽지 않다. 말하자면 적들이 어벤져스의 능력을 알면서도 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
| /사진제공=이현지 칼럼니스트 |
경기 당일 아침부터 그날 경기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바르셀로나 전체가 들썩거렸다. 곳곳에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녔고,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경기장 근처의 펍에 모여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FC바르셀로나 플래그를 들고 걸어가는 나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많았다. 경기가 시작될 때 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7만 관중들 사이에서 자리를 뜨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유일한 시민의 구단 FC바르셀로나의 117년 역사라든지, 2014년 수많은 리스크를 안고 카탈루냐의 독립을 지지했던 사연, 스폰서의 이름이 아닌 유니세프의 마크를 가슴에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려져 있어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도시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의 축구팀, 그 팀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 곳곳의 골목길에서 축구공을 차며 꿈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한국과 사뭇 달랐다.
물론 이제 막 34년째에 접어든 K리그를 FC바르셀로나와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 축구가 어떤 방식으로 인재를 키워내고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2002년, 자연스럽게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들었던 붉은 악마들의 모습은 충분히 그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결국 위로부터 만들어내는 시스템보다 아래에서부터의 지역 친화적 자생력이 먼저다. 국내 축구팬들의 눈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지금, 한국 축구에 대한 비판이나 선수들에 대한 비난보다 먼저 그때의 자발적인 열정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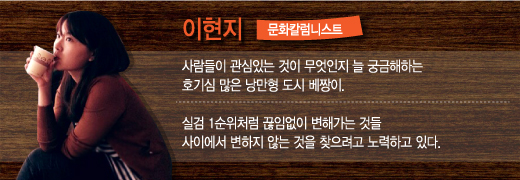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