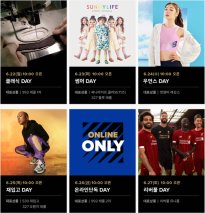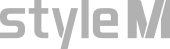홀연히 사라진 어느 대학가 수제버거의 장인을 찾아서
[김성찬의 알리오올리오⑤]세상에 단 하나 뿐인 매력적인 버거
머니투데이 스타일M 김성찬 칼럼니스트 | 2014.07.02 09:23 | 조회
5619
맛집이 범람하고 갖가지 음식사진이 올라오는 시대다. 혼자 알기 아까운 맛집과 맛있는 음식 있으면 '알리오', 사진도 찍어 '올리오'.
 |
| /사진=김성찬 |
그를 처음 만난 건 대학 시절 자취를 하던 때다. 자취생들이 대부분 그렇듯 매번 끼니 때우기가 어려워 자주 외식을 하다가 그의 가게를 발견했다. 그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다. 미국 영화에나 등장하는 큰 덩치의 요리사 같았는데 그릴에 패티를 굽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과묵히 요리만 하는 모습에선 일종의 카리스마가 느껴지기도 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슬쩍 보이는 문신도 그런 인상을 주는 데 한몫했다. 작은 규모의 가게와 어울리지 않는 거장처럼 보였다.
그가 만든 버거를 맛보고는 거장임을 확신했다. 흔한 패스트푸드점 햄버거는 따라올 수 없는 풍부함과 건강함이 느껴졌다. 특히 닭가슴살 칠리버거가 일품이었다. 그릴에 구운 닭가슴살은 특유의 퍽퍽함이 없었고 숯불구이 내음도 더해져 씹는 맛이 좋았다. 다른 버거도 특별했다.
일반적인 가게였다면 싼 가격만큼 빵 사이에 들어갈 것들이 부실했을텐데 그의 버거는 야채나 고기 패티가 풍부한 것은 물론이고 계란이 두 개나 들어갔다. 무엇보다 핫도그를 먹을 때면 마치 뉴욕의 어느 길거리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본토의 맛이 느껴졌다. 그래서인지 패스트푸드점에서 기계로 찍어낸 듯 천편일률적인 햄버거를 먹을 때마다 그의 버거가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진작부터 옮겼다는 가게에 찾아가 보고 싶었다. 그러나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던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다.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 기억을 신뢰할 수 없어서였다. 어떤 게 너무 먹고 싶었지만 막상 먹게 되면 실망하는 일이 많지 않던가.
마치 그리운 첫사랑이 표독스러운 아줌마나 배불뚝이 중년 아저씨로 변한 모습을 보고는 차라리 보지 말걸 그랬다고 후회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평생을 그리워할 수만은 없다. 실망하고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이번엔 반드시 찾아가 보기로 했다. 본점이라는 가게가 먼저다. 그가 만약 가게에 있다면 2호점보다는 본점에 있을 것 같았다.
 |
| /사진=김성찬 |
그는 심지어 친절하기까지 했다. 일요일 아침 너무 일찍 그의 가게를 찾았다가 잠긴 문을 뒤로 하고 돌아서는데 마침 출근하던 그가 나를 불러 세우곤 바로 가게 문을 열어 닭가슴살 칠리버거를 만들어 주었다. 때론 가게 문을 잠시 닫고 메뉴에 없는 걸 만들어 주기도 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도 그 중 하나였는데 훨씬 싼 가격에도 더 맛났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점이라는 가게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주문을 받고 있었다. 실망스러웠지만 들어온 이상 그대로 나갈 수는 없어 버거를 주문했다. 안타깝게도 닭가슴살 칠리버거는 메뉴에 없었다. 대신 치킨 칠리버거라는 게 있었다. 숯불구이향이 나는 걸 보니 아무래도 그에게 전수받은 솜씨 같았다.
하지만 온전한 그의 버거라고는 할 수 없었다. 실망한 마음을 비슷한 맛으로 미약하게나마 달랠 뿐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가 이미 다른 곳으로 간 줄 모르고 가게에 들렀다가 다른 사람이 만든 닭가슴살 칠리버거를 먹고선 전혀 다른 맛이었던 탓에 크게 낙심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계산을 하면서 가게 주인에게 그에 대해 물었다. 주인은 그가 이미 몇 년 전에 이곳을 넘기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말해주었다. 어디로 갔는지는 자기도 모른다고 했다. 뒤늦게 인터넷을 살펴보니 그는 매번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고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듯했다. 마치 무림의 고수가 제자를 양성하고 홀연히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최근 행적은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과연 숨은 장인다운 행보다.
다음에는 홍대에 있다는 2호점에 가 그를 찾아보려고 한다. 그는 2호점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다른 곳으로 갔을까. 아니면 아직 거기에 있을까. 그는 왜 매번 가게를 넘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걸까. 그의 버거가 그리운 만큼이나 그의 행적도 궁금하다. 그나저나 나는 왜 그에게 집착하는가. 같은 음식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그 맛은 전혀 다르다. 훌륭한 요리사가 만든 음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뉴가 된다. 그의 버거도 단지 버거가 아니다. '머피스 버거'다. 세상에 하나뿐인 버거. 매력적이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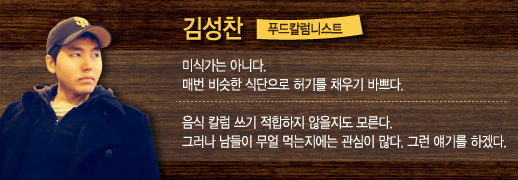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