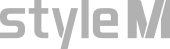식상한 시상식, 언제까지 그들만의 축제로 남을 것인가
[이현지의 컬티즘<29>] 시청자 위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스타일M 이현지 칼럼니스트, | 2015.01.05 09:03 | 조회 4534
컬티즘(cultism). 문화(culture)+주의(ism)의 조어. 고급문화부터 B급문화까지 보고 듣고 맛보고 즐겨본 모든 것들에 대한 자의적 리뷰이자 사소한 의견.
 |
| /사진=머니투데이 DB |
'방송사 종무식', '그들만의 축제'라는 비아냥을 들을 만큼 시상식은 매년 시청자들을 실망시켜왔다. 올해도 다르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골고루 수상자들에게 상을 나눠줄지를 고민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쏟아지는 상들과 모호한 수상기준, 급하게 준비한 티가 역력한 어설픈 퍼포먼스들, 매년 비슷한 MC와 예측을 전혀 벗어나지 않는 수상자까지 그동안의 실망 요소들을 그대로 답습한 시상식이었다.
 |
| /사진=머니투데이 DB |
굳이 외국의 그래미상 시상식이나 아카데미상 시상식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연말 시상식이 국내 방송 프로그램 수준에도 현저히 못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해외로도 콘텐츠를 수출하고 있는 감독들의 연출력과 시청자들을 웃고 울리는 작가들의 재치 있는 입담, 한류를 몰고 다니는 연예인들의 끼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
| /사진=머니투데이 DB |
연말이라 회사에서도 전 직원이 모이는 회사 행사를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받는 상과 상금을 올해도 팀 내에서 몇 명이 받았다. 그나마 작년에는 사장 지시로 간부급 임원들이 크레용팝의 '빠빠빠'를 추는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없었다. 초빙한 외부 마술사가 신기하지 않은 마술쇼를 보여주고 끝났다. '조금 더 재밌게 기획할 수 없나'라는 생각을 모두가 했다. 하지만 누군가 붙잡고 추진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내년 연말이 다가올 것이다. 방송사 연말 시상식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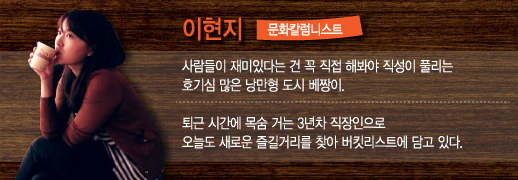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