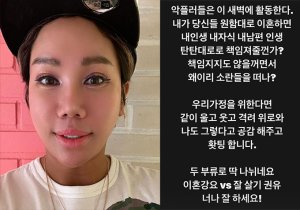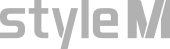нҸӯн’Қм„ұмһҘ л©Ҳм·„лӢӨвҖҰм „нҷҳкё° л§һмқҖ нҷ”мһҘн’Ҳ лёҢлһңл“ңмҲҚ
мғҒмң„ 10к°ң лёҢлһңл“ң 2010~2016л…„ мӢӨм Ғ 분м„қвҖҰ2011~2013л…„ м •м җ, м •мІҙкё°м—җ л§Өм¶ң м—ӯмӢ мһҘн•ң м—…мІҙлҸ„
лЁёлӢҲнҲ¬лҚ°мқҙ мҶЎм§Җмң кё°мһҗ, л°°мҳҒмңӨ кё°мһҗ | 2017.04.25 04:44 | мЎ°нҡҢ
15503
 |
| мӨ‘көӯ м •л¶Җк°Җ н•ңкөӯ кҙҖкҙ‘ кёҲм§Җл №мқ„ лӮҙлҰ° м§ҖлӮң 3мӣ”15мқј мҳӨнӣ„ м„ңмҡё мӨ‘кө¬ лӘ…лҸҷкұ°лҰ¬. кҙҖкҙ‘к°қмқҙ м—Ҷм–ҙ н•ңмӮ°н•ң лӘЁмҠөмқҙлӢӨ. 2017.3.15/лүҙмҠӨ1 <м Җмһ‘к¶Ңмһҗ © лүҙмҠӨ1мҪ”лҰ¬м•„, л¬ҙлӢЁм „мһ¬ л°Ҹ мһ¬л°°нҸ¬ кёҲм§Җ> |
көӯлӮҙ нҷ”мһҘн’Ҳ лёҢлһңл“ңмҲҚ мӢңмһҘмқҙ мҲЁкі лҘҙкё°м—җ л“Өм–ҙк°”лӢӨ. 'Kл·°нӢ°' м—ҙн’Қмқҳ мЈјм—ӯмңјлЎң л– мҳӨлҘҙл©° мөңк·ј мҲҳл…„к°„ нҸӯн’Қм„ұмһҘн•ң м—…мІҙл“ӨмқҖ мӢӨм Ғ м •мІҙкё°лҘј л§һм•ҳлӢӨ. кІҪкё° м№ЁмІҙмҷҖ нҠёл Ңл“ң ліҖнҷ”, мӨ‘көӯ мӮ¬л“ң(THAADВ·кі кі лҸ„лҜёмӮ¬мқјл°©м–ҙмІҙкі„) к°Ҳл“ұ л“ұмқҙ ліөн•©м ҒмңјлЎң мһ‘мҡ©н–ҲлӢӨлҠ” 분м„қмқҙлӢӨ.
24мқј лЁёлӢҲнҲ¬лҚ°мқҙк°Җ көӯлӮҙ нҷ”мһҘн’Ҳ лёҢлһңл“ңмҲҚ мғҒмң„ 10к°ңмӮ¬мқҳ мөңк·ј 7л…„к°„(2010~2016л…„) мӢӨм Ғмқ„ 분м„қн•ң кІ°кіј 2014л…„к№Ңм§Җ м—° нҸүк· 20~30% м•ҲнҢҺм—җ лӢ¬н–ҲлҚҳ л§Өм¶ң м„ұмһҘлҘ мқҖ м§ҖлӮңн•ҙ 12.8%лЎң лӮ®м•„мЎҢлӢӨ. н•ң мһҗлҰҝмҲҳ м„ұмһҘм—җ к·ём№ҳкұ°лӮҳ мҳӨнһҲл Ө л§Өм¶ңмқҙ к°җмҶҢн•ң м—…мІҙл“ӨлҸ„ мһҲлӢӨ.
в—Ү2011~2013л…„ мӢңмһҘ м •м җвҖҰм •мІҙкё° мқҙлҜё мӢңмһ‘лҗҗлӢӨ=м§ҖлӮңн•ҙ 1мң„ лёҢлһңл“ңмқё мқҙлӢҲмҠӨн”„лҰ¬лҠ” л§Өм¶ңм•Ў 7679м–өмӣҗмңјлЎң м „л…„ліҙлӢӨ 30% лҠҳм–ҙлӮң мӢӨм Ғмқ„ кё°лЎқн–ҲлӢӨ. м—җлӣ°л“ң(4мң„)мҷҖ л°”лӢҗлқјмҪ”(9мң„), лҚ”мғҳ(10мң„)лҸ„ к°Ғк°Ғ 23%, 30%, 95% мҰқк°Җн•ң л§Өм¶ңмқ„ мҳ¬л ёлӢӨ.
н•ҳм§Җл§Ң 2мң„ м—…мІҙмқё лҚ”нҺҳмқҙмҠӨмғө(3%)мқ„ 비лЎҜн•ҙ 3мң„ м—җмқҙлё”м”Ём—”м”Ё(лҜёмғӨВ·7%), 7мң„ нҶ лӢҲлӘЁлҰ¬(6%), 8мң„ мҠӨнӮЁн‘ёл“ң(3%) л“ұмқҳ л§Өм¶ң мҰқк°ҖмңЁмқҖ нҸүк· м№ҳлҘј нӣЁм”¬ л°‘лҸҢм•ҳлӢӨ. мһҮмё мҠӨнӮЁ(5мң„)кіј л„ӨмқҙмІҳлҰ¬нҚјлё”лҰӯ(6мң„)мқҖ м „л…„ліҙлӢӨ л§Өм¶ңм•Ўмқҙ к°Ғк°Ғ 16%, 8% к°җмҶҢн•ҳлҠ” л§Ҳмқҙл„ҲмҠӨ мӢӨм Ғмқ„ лғҲлӢӨ.
м—°лҸ„лі„ мӢӨм Ғ м„ұмһҘлҘ мқҖ м—…мІҙлі„лЎң м°Ёмқҙк°Җ мһҲм§Җл§Ң лҢҖмІҙлЎң 2011~2013л…„ к°ҖмһҘ лҶ’м•ҳкі мқҙнӣ„ м җм°Ё лӮ®м•„м§ҖлҠ” 추세лӢӨ. м—җмқҙлё”м”Ём—”м”Ёмқҳ кІҪмҡ° 2013~2015л…„к№Ңм§Җ л§Өм¶ңм•Ўмқҙ к°җмҶҢн•ҳлҠ” м—ӯмӢ мһҘм—җм„ң лІ—м–ҙлӮҳм§Җ лӘ»н–ҲлӢӨ. нҠ№нһҲ мөңк·јм—җлҠ” лҢҖкё°м—…мқҙ мҡҙмҳҒн•ҳлҠ” лёҢлһңл“ңмҲҚ мӮ¬м •лҸ„ л…№лЎқм§Җ м•ҠмқҖ мғҒнҷ©мқҙлӢӨ. м•„лӘЁл ҲнҚјмӢңн”Ҫмқҳ мқҙлӢҲмҠӨн”„лҰ¬мҷҖ LGмғқнҷңкұҙк°•мқҳ лҚ”нҺҳмқҙмҠӨмғөлҸ„ мҳ¬ 1분기 мқҙмқөмқҙ к°җмҶҢн•ҳлҠ” мӢӨм Ғмқ„ кё°лЎқн–ҲлӢӨ.
мғҒмң„ м—…мІҙл“Өмқҳ л§Өм¶ң м„ұмһҘм„ёк°Җ мЈјм¶Өн•ҙм§Җл©ҙм„ң л¬ҙм„ңмҡҙ мҶҚлҸ„лЎң м»Өм§ҖлҚҳ м „мІҙ лёҢлһңл“ңмҲҚ мӢңмһҘлҸ„ м„ұмһҘ мҶҚлҸ„к°Җ лҚ”лҺҢмЎҢлӢӨ. көӯлӮҙ лёҢлһңл“ңмҲҚ мӢңмһҘмқҖ 2010л…„ мІ« 1мЎ°мӣҗмқ„ лҸҢнҢҢн•ң мқҙнӣ„ 2011л…„ 1мЎ°5000м–өмӣҗ, 2012л…„ 2мЎ°3000м–өмӣҗ л“ұмңјлЎң м—° нҸүк· 50% мқҙмғҒ кёүм„ұмһҘн–ҲлӢӨ. мқҙнӣ„ 2013л…„ 2мЎ°6000м–өмӣҗ(13%вҶ‘), 2014л…„ 2мЎ°9000м–өмӣҗ(11.5%вҶ‘), 2015л…„ 3мЎ°2000м–өмӣҗ(10.3%вҶ‘), 2016л…„ 3мЎ°5000м–өмӣҗ(9.3%вҶ‘) л“ұмңјлЎң м§ҖлӮңн•ҙ мІҳмқҢмңјлЎң н•ң мһҗлҰҝмҲҳ м„ұмһҘм—җ к·ёміӨлӢӨ.
 |
в—ҮмӢңмһҘкіјм—ҙВ·нҠёл Ңл“ң ліҖнҷ”вҖҰн•ҙмҷём§„м¶ңВ·нҺём§‘мҲҚ м „нҷҳ мғқмЎҙ лӘёл¶ҖлҰј=нҷ”мһҘн’Ҳ мӢңмһҘ м„ұмһҘмқ„ кІ¬мқён–ҲлҚҳ лёҢлһңл“ңмҲҚмқҙ м •мІҙкё°лҘј л§һмқҖ кІғмқҖ м—…мІҙк°Җ мҡ°нӣ„мЈҪмҲң лҠҳм–ҙлӮҳл©ҙм„ң кІҪмҹҒмқҙ мӢ¬нҷ”н–Ҳкё° л•Ңл¬ёмқҙлӢӨ. мғқмЎҙмқ„ мң„н•ҙ көӯлӮҙм—җм„ '365мқј м—°мӨ‘м„ёмқј', н•ҙмҷё мӢңмһҘ нҷ•мһҘ кІҪмҹҒм—җ лӮҳм„°лҠ”лҚ° мқҙкІғмқҙ мӢ к·ң кі к°қ нҷ•ліҙ л“ұ л§Өм¶ңлЎң мқҙм–ҙм§Җм§Җ лӘ»н•ҳкі мқҙмқөлҘ м Җн•ҳ л“ұ мӢӨм Ғ м•…нҷ”лқјлҠ” л¶Җл©”лһ‘мңјлЎң лҸҢм•„мҳЁ кІғмқҙлӢӨ.
2000л…„лҢҖ мӨ‘л°ҳ лёҢлһңл“ңмҲҚ мӢңмһҘмқҙ ліёкІ© нҷ•лҢҖлҗң м§Җ 10м—¬л…„мқҙ м§ҖлӮҳл©ҙм„ң мҶҢ비 нҠёл Ңл“ңк°Җ ліҖнҷ”н•ң кІғлҸ„ н•ң мҡ”мқёмқҙлӢӨ. лёҢлһңл“ңмҲҚмқҖ м Җл ҙн•ҳкі н’Ҳм§Ҳ мўӢмқҖ нҷ”мһҘн’ҲмқҙлқјлҠ” мҪҳм…үнҠёлЎң кі к°Җмқҳ мҲҳмһ… нҷ”мһҘн’Ҳ мӨ‘мӢ¬мқҳ л°ұнҷ”м җ мң нҶө мұ„л„җ кі к°қл“Өмқ„ нқЎмҲҳн–ҲлҠ”лҚ° мөңк·ј мҳЁлқјмқёВ·лӘЁл°”мқјВ·нҺём§‘мҲҚ л“ұмңјлЎң мһ¬нҺёлҗҳлҠ” нҠёл Ңл“ң ліҖнҷ”м—җ л°ҖлҰ¬кі мһҲлӢӨлҠ” н•ҙм„қмқҙлӢӨ. мӢӨм ң лҢҖн‘ңм Ғмқё нҺём§‘л§ӨмһҘмқё мҳ¬лҰ¬лёҢмҳҒмқҖ 2013л…„ 4578м–өмӣҗмқҙлҚҳ л§Өм¶ңм•Ўмқҙ 2014л…„ 6311м–өмӣҗ, 2015л…„ 7604м–өмӣҗ, 2016л…„ 1мЎ°1270м–өмӣҗмңјлЎң кёүмҰқн–ҲлӢӨ. 3л…„мғҲ 146% мҰқк°Җн•ң м…ҲмқҙлӢӨ.
м—…кі„ н•ң кҙҖкі„мһҗлҠ” "нҷ”мһҘн’Ҳ мӢңмһҘмқҳ н•ң 축мқё лёҢлһңл“ңмҲҚмқҳ м„ұмһҘм„ёк°Җ мөңк·ј мЈјм¶Өн•ң кІғмқҖ мӮ¬мӢӨмқҙм§Җл§Ң н•ҙмҷёмӢңмһҘ 진м¶ң, мӢ м ңн’ҲВ·мӢ мң нҶө к°ңл°ң л“ұмңјлЎң м—…мІҙл§ҲлӢӨ м ң2мқҳ м„ұмһҘмқ„ лӘЁмғүн•ҳкі мһҲлӢӨ"л©° "мӨ‘көӯкіј мҷёкөҗ к°Ҳл“ұмңјлЎң мҲҳм¶ңмқҙлӮҳ мҳҒм—…м—җ м• лҘј лЁ№лҠ”лӢӨкі Kл·°нӢ°мқҳ кІҪмҹҒл Ҙмқҙ мӮ¬лқјм§„ кІғмқҖ м•„лӢҢ л§ҢнҒј лӢӨм–‘н•ң нҢҗлЎңлҘј к°ңмІҷн•ҳлҠ” кІғмқҙ л°”лһҢм§Ғн•ҳлӢӨ"кі л§җн–ҲлӢӨ.
 |
<м Җмһ‘к¶Ңмһҗ © вҖҳлҸҲмқҙ ліҙмқҙлҠ” лҰ¬м–јнғҖмһ„ лүҙмҠӨвҖҷ лЁёлӢҲнҲ¬лҚ°мқҙ, л¬ҙлӢЁм „мһ¬ л°Ҹ мһ¬л°°нҸ¬ кёҲм§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