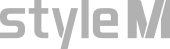명품 브랜드 A/S, 어디까지 해봤니?
아이스타일24 제공 | 2010.12.28 15:59 | 조회
3762
명품이라 불리는 고가의 가방과 신발을 큰 맘 먹고 샀다. 하지만 웬걸. 몇 번 들고, 신고 다녔을 뿐이었다. 신발의 스트랩과 가방 줄이 끓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마음이 아팠지만, 명품이니까 뭔가 다르리라는 믿음으로 매장을 향했다. 그 결과는?
◆ 명품이 명품다워야 명품이지
지름신 강림에 무력했던 사회 초년생 시절, 감당하지도 못할 거면서 카드를 긁어대곤 했던 기억이 내게도 있다. 왠지 신제품을 들고 거리로 나가면 수많은 눈들이 나의 가방을 바라보는 것만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 알 수 없는 우쭐함은 자기만족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시즌별로 등장하는 명품 사재기에 열을 올리곤 했다.
물론, 그럴수록 통장잔고는 줄어갔지만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여자가 할 수 있는 자기투자 중 가장 손쉬운 것으로 여겨졌으니까. 벼르고 벼르던 가방과 신발을 지르기 위해서 C브랜드 매장으로 향한 어느 날 이었다. 무이자할부로 긁은 그 녀석들은 내 손에 들려졌고, 내 발에 신겨졌다. 의기양양하며 매장을 나오던 찰나, 백화점 앞에 있던 아스팔트 위에서 스트랩 샌들이 툭하고 끊겨졌다.
구입한 지 10분도 안되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매장으로 달려가 끊어진 줄을 보여주며 교환을 요청했다. 떨떠름해 하는 직원의 눈길을 뒤로한 채 새롭게 받아든 신발을 고히 모셔왔다가 며칠 뒤 약속장소에 신고 나갔다. 그리고는 툭. 한걸음에 달려가 직원에게 보여줬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다. “손님, 이 제품은 본사로 보내져야 해서 수선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릴 듯합니다.
영동사나 명동사로 바로 가시는 게 오히려 시간이 절약되실 겁니다. 저희도 급한 물건들은 이곳에 맡기곤 하니 실력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시계줄 하나 바꾸는데 한 달은 족히 걸리고, 산 지 일주일도 안되서 끊어진 신발 끈 수선이 3달이 걸린다고? 게다가 내 돈주고 수선 집에 이것들을 맡기라고? 뭔지 모르게 억울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부실하게 만든 자기네들은 당당하고, 항의하러 간 나는 주눅이 드는 이 분위기는 도대체 뭐지? 게다가 고고하고 고압적인 태도는 불쾌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리고, 몇 달 뒤, 함께 구입했던 가방의 줄도 뚝 하고 끊어졌다. 고민할 것도 없이, 매장 대신 수선집을 찾아갔다. 국내 명품 시장 규모는 연간 5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A/S의 품질이나 매장 직원의 태도 같은 서비스는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듯 하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명품 관련 민원이 500여건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온 걸 보면 말이다. 심지어 한국소비자원의 품질 심의조차 통하지 않는다니 황당한 노릇이다. 이유인즉, 글로벌 기업이어서 한국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다. 엄연히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면서 한국 규정을 따를 수 없다니, 이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태도가 다르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 뭔가 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
사람들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에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다. 내놓라하는 집안 내력과 우월한 학력같은 화려한 스펙 쌓기부터 빛나는 외모와 몸매 까지 내적인 부분보다 외적인 부분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명품’ 같은 값비싼 물건을 통해 차별화 욕구를 충족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명품의 사전적 의미는 ‘뛰어난 물건’으로, ‘오랜 역사와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장인 정신에 입각한 예술적 감성을 지닌 정성이 담겨진 물건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요즘의 명품은 본래의 순수성은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장인이 만든 제품이라면서 수선 집에 A/S를 맡기라고 권하는 것이 과연 명품다운 행동은 아니라는 말이다.
어느 순간부터 런칭한 지 10년도 안되는 브랜드들이 자칭 ‘럭셔리 명품 브랜드’임을 자처하고 있는 지경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것들마저 자신들의 브랜드 철학을 떠나 판매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적게는 수 십 만원, 많게는 수 천만 원 대의 명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심리에는 제품의 퀼리티 이외에도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VVIP가 아닌 이상, 매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줄을 서야 하고, 구석구석 CCTV를 설치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매장으로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 부디 명품들이여, 이왕이면 가격 못지않는 럭셔리한 애티튜드로 맞이해주길 바란다. 그러면, 나같이 심약한 중생들의 마음을 더욱 확고히 사로잡을 수 있다고 장담한다.
*본 이미지는 컬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저작권자(c) iSTYLE24, 출처: 아이스타일24 패션매거진>
*본 컨텐츠 (또는 기사)는 아이스타일24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명품이 명품다워야 명품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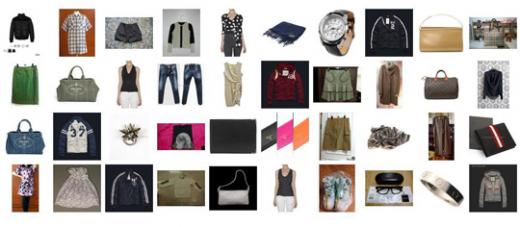 |
물론, 그럴수록 통장잔고는 줄어갔지만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여자가 할 수 있는 자기투자 중 가장 손쉬운 것으로 여겨졌으니까. 벼르고 벼르던 가방과 신발을 지르기 위해서 C브랜드 매장으로 향한 어느 날 이었다. 무이자할부로 긁은 그 녀석들은 내 손에 들려졌고, 내 발에 신겨졌다. 의기양양하며 매장을 나오던 찰나, 백화점 앞에 있던 아스팔트 위에서 스트랩 샌들이 툭하고 끊겨졌다.
구입한 지 10분도 안되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매장으로 달려가 끊어진 줄을 보여주며 교환을 요청했다. 떨떠름해 하는 직원의 눈길을 뒤로한 채 새롭게 받아든 신발을 고히 모셔왔다가 며칠 뒤 약속장소에 신고 나갔다. 그리고는 툭. 한걸음에 달려가 직원에게 보여줬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다. “손님, 이 제품은 본사로 보내져야 해서 수선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릴 듯합니다.
 |
그리고, 몇 달 뒤, 함께 구입했던 가방의 줄도 뚝 하고 끊어졌다. 고민할 것도 없이, 매장 대신 수선집을 찾아갔다. 국내 명품 시장 규모는 연간 5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A/S의 품질이나 매장 직원의 태도 같은 서비스는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듯 하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명품 관련 민원이 500여건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온 걸 보면 말이다. 심지어 한국소비자원의 품질 심의조차 통하지 않는다니 황당한 노릇이다. 이유인즉, 글로벌 기업이어서 한국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다. 엄연히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면서 한국 규정을 따를 수 없다니, 이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태도가 다르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 뭔가 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
 |
명품의 사전적 의미는 ‘뛰어난 물건’으로, ‘오랜 역사와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장인 정신에 입각한 예술적 감성을 지닌 정성이 담겨진 물건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요즘의 명품은 본래의 순수성은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장인이 만든 제품이라면서 수선 집에 A/S를 맡기라고 권하는 것이 과연 명품다운 행동은 아니라는 말이다.
 |
VVIP가 아닌 이상, 매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줄을 서야 하고, 구석구석 CCTV를 설치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매장으로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 부디 명품들이여, 이왕이면 가격 못지않는 럭셔리한 애티튜드로 맞이해주길 바란다. 그러면, 나같이 심약한 중생들의 마음을 더욱 확고히 사로잡을 수 있다고 장담한다.
*본 이미지는 컬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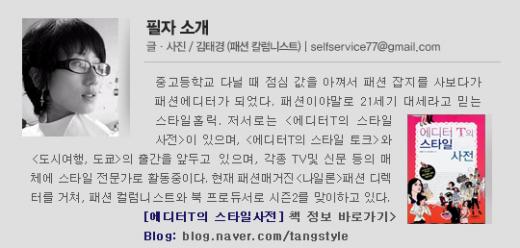 |
*본 컨텐츠 (또는 기사)는 아이스타일24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