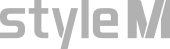"느리지만 괜찮아"…다섯 시간을 달려 만난 '일출'
[김은혜의 노닐다-3] 정동진 일출을 보다
익숙했던 것들에서 낯선 무언가를 보거나, 낯선 곳에서 익숙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 이곳저곳 방방곡곡을 노닐다.

/사진제공=김은혜 칼럼니스트
"언니, 해 보러 갈래요?"
대학시절 함께 울고 웃었던 친한 동생으로부터 오랜만에 온 연락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밤기차를 타기로 했다. 아무 계획은 없었다. 자정을 조금 남긴 시간, 청량리 발 정동진행 기차를 타야한다는 것만 정해져있을 뿐. 오랜만에 본 청량리역은 말끔한 옷을 입고 광장 앞에 서 있었다. 이전 낡은 역사에서 경춘선을 타고 동아리 엠티를 갔던 기억들이 스쳤다.
목적지 정동진까지는 다섯 시간. 그럼에도 열차내부는 입석까지 꽉 들어차 조금 답답하기까지 했다. 기차의 창문은 흑빛의 바깥 풍경 대신 북적북적한 열차 내부를 비추며 달렸다. 창문너머로 비추어 보이는 많은 이들이 쪽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들의 감은 눈에 많은 감정들이 묻어 나온다. 누군가에겐 눈에 담아갈 동해바다와 일출에 대한 기대를, 누군가에겐 지나온 시간에 대한 조용한 정리를, 누군가에겐 보고 싶은 타인에 대한 그리움을 각자 품고 밤기차는 천천히 달리고 달렸다.
영월, 태백을 지날 즈음에는 지대가 높아서인지 귀가 조금 멍멍해졌다. 지난여름 태백시에 갔을 때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앞에서 해발 680m라는 비석을 본 기억이 나 어렴풋이 강원도에 다다랐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정동진이라는 이름은 과거 한양 광화문에서 정동(正東)의 방향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지만 기차는 정동(正東)으로 내달릴 수 없기에 중앙선과 태백선, 영동선을 이어 달린다. 실제로도 정동진은 광화문보다는 조금 남쪽이다. 기차는 그렇게 밤새도록 태백산맥을 넘었다.

/사진제공=김은혜 칼럼니스트
새벽4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 정동진에 도착했다. 8년 전 왔을 때는 플랫폼에 내리자마자 바다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안타까웠다. 해를 보려면 세 시간 정도 남았기에 우리는 실내에서 시간을 보낼 곳을 찾았다. 기차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24시간 운영하는 카페에 많이 가는 듯 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커피숍이 아닌 작은 포장마차였다.
강원도 사투리의 지역 뉴스가 흘러나오는 작은 텔레비전을 보며 잔치국수 두 그릇을 주문했다. 힐끗힐끗 주방을 구경하니 허둥대지 않고 차분하게 손님들의 주문을 받아 차근차근 음식을 만드는 남자 주인장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내어 온 새벽 4시의 잔치국수 맛은 더욱 더 인상적으로 맛있었고.

/사진제공=김은혜 칼럼니스트
일곱시부터는 사람들이 서서히 바다로 모이기 시작한다. 다 같이 동쪽을 바라보며 여명을 맞이한다. 한 해가 며칠남지 않았기 때문인지 다들 ‘올 한해 수고했다’며 덕담을 나누는 모습도 보인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반대쪽 하늘에는 아직 달이 떠 있다. 나도 아직 여기 있으니 봐 달라는 듯이. 밤과 아침이 공존하는 이 시간이 신비롭다. 어느새 소음은 잦아들고 규칙적인 듯 불규칙한 파도소리만 귀를 가득 메운 채 조용히 해를 기다린다.
이 순간을 위해 일출을 본다. 아침이 온다는 것이 반복적인 새 하루의 시작을 뜻하는 것만이 아님을 일출을 통해 느낀다. 밤과 아침은 0과 1로 나뉘는 디지털 부호마냥 불연속적인 것이 아닌 천천히 조화롭게 이어지는 연속적인 것임을 깨닫는다. 희미하게 빛이 날아오르는 순간부터 미미하게 해가 솟아오르는 그 연속적인 과정은 언제 봐도 새로우면서도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평정심을 갖게 한다. 다섯 시간의 고단함도 이 순간 눈 녹듯 사라졌다.

/사진제공=김은혜 칼럼니스트
해는 완전히 모습을 보이고 바다와 세상을 밝힌다. 여느 날과는 다른, 다를 하루의 시작이다. 무모하게도 우리는 돌아올 때도 다시 기차를 탄다. 다섯 시간을 달려 도착해 세 시간의 새벽을 견디고 동해바다에 뜨는 해를 한 시간 동안 보고, 다시 다섯 시간이 걸릴 무궁화호에 몸을 싣는다. 밤이라서 보지 못했던 창밖 풍경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다.
해안을 달리는 기차 왼쪽으로 태양에 빛나는 바다가 펼쳐져있다. 고속열차에서는 볼 수 없는 간이역과 소소한 겨울의 풍경들이 우리 곁을 함께 스친다. 무모하지만 괜찮다. 느리지만 괜찮다. 다시는 오지 않을 오늘의 단상을 눈에 담을 수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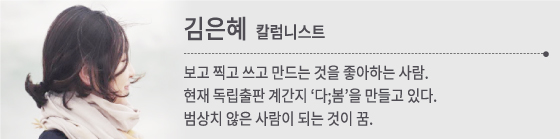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김혜자, 데뷔 64년 만에 '최초'로 화장품 모델 발탁](https://thumb.mt.co.kr/06/2025/04/2025041709565316298_1.jpg/dims/resize/300x/optimize/)
![[영상]택배 상자 속에 잘린 손이](https://thumb.mt.co.kr/06/2025/04/2025041614271091877_1.jpg/dims/resize/300x/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