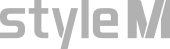늦은 밤에만 걸려오는 썸남의 전화…"○○ 하고 싶다"
[김정훈의 썸①]사랑, 설렐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로 설레지 않게 돼버린다
썸. 묘한 단어가 등장했다. 짜릿한 흥분과 극도의 불안감이 공존하는 롤러코스터 마냥, 탈까 말까 망설여지기도 하고. 간질간질. 정체를 알 수 없는 간지러움에 마냥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사랑만큼 떨리지만 이별보다 허무한 썸.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썸'에 대한 연애칼럼니스트 김정훈의 토킹 릴레이.

시침과 분침이 겹쳐지는 자정의 긴장감은 묘하다. 시작과 끝을 동시에 알리는 시계바늘의 결합을 보고 있자니 최근 고민을 상담해 온 여자 후배가 떠올랐다. 그녀는 밤만 되면 걸려오는 썸남의 전화가 골치라고 했다.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쯤은 반드시 걸려오는 그의 전화를 완전히 피할 수가 없단다. 나는 해결책을 제시해 줬다.
-시침과 분침이 결합하는 0시를 남자가 섹스하고 싶어 하는 순간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0시가 다 돼서야 전화하는 그 녀석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냥 너랑 잠만 자고 싶을 뿐이라고. 자정에서 멀리 떨어진 시간에 만나려는 남자일수록, 너와 다양한 걸 하고 싶어 한다 생각하면 편해.
- 오빠, 내가 설마 그런 걸 모르겠어? 문제는 걔가 아니라 나야. 하고 싶지가 않아. 섹스든 뭐든.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는 말엔 심드렁한 대꾸로 넘기지만 밤만 되면 취한 목소리로 연락하는 그의 속내는 진즉 파악하고 있었단다. 그게 파악된다는 것, 심지어 그게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게 문제라고 했다. 섹스하고 싶단 그의 말이 더 이상 기분 나쁘지도, 그렇다고 반길 수도 없는 감정이 30대의 허무함인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차라리 남자가 왜 밤에만 연락을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던 옛날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단다. 가랑잎이 바스락거리는 것만 봐도 깔깔 거리던 여고시절까지 바라는 건 아니다. 이성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늘 궁금해 하던 20대. 그것을 마주하려는 호기심과 그 실체를 알았을 때의 두려움으로 가슴 떨리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했다. 더 이상 설렘을 느낄 수 없다며, 다시 두근거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난 당연히 183㎝까지 키가 클 줄 알았다. 그런데 입대를 하고 제대를 하고, 졸업 후 입사를 할 때 까지도 170㎝ 중반의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성장판이 닫혀 버린 게 원인이라고들 한다. 30대가 되면 사랑에 대해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서툴기만 했던 시작은 자연스러워 지고, 이별에 따른 감정도 쿨하게 처리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현실은 달랐다. 쿨한 만남은 점점 부자연스러워졌고, 잦은 이별로 인한 감정의 재만 축적돼버렸다. 허무한 관계와 공허한 감정을 채우지 못하는 불안감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래도 난 여전히 키가 자라고 있다 믿고 있다. 취침 전과 후에 조금씩 스트레칭을 하고, 우유도 많이 먹는다. 그러다보면 죽기 전엔 분명 0.01센티 정도는 자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다.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문제는 스스로의 신념이다. 설렐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로 설레지 않게 돼버린다. 예전과 변함없이 존재하는 외부의 신호를, 겹겹이 무장된 필터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개인의 마음가짐 때문이다. 그 상황을 허무함으로 단정 짓게 된 것도 남이 아닌 우리 자신이다. 변한 게 외부가 아니라 개인이란 건 참 다행이다.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사랑의 성장판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그런데 30대 남자들의 문제는 조금 달랐다. 남자들만 모인 채팅 방에 삼십대의 신호, 그리고 허무함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그들의 걱정은 심플했다.
'상대가 신호를 보내는데 할 수 없는 것.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서지 않는 것'.
다음 글에선 그들의 속내에 대해 얘기 하고 싶다.
2014년 6월5일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김혜자, 데뷔 64년 만에 '최초'로 화장품 모델 발탁](https://thumb.mt.co.kr/06/2025/04/2025041709565316298_1.jpg/dims/resize/300x/optimize/)
![[영상]택배 상자 속에 잘린 손이](https://thumb.mt.co.kr/06/2025/04/2025041614271091877_1.jpg/dims/resize/300x/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