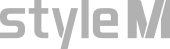'치유' 필요한 2016년…초록숲을 기다리는 이유
[김은혜의 노닐다-4] 전라남도 화순 '숲정이'를 추억하다
익숙했던 것들에서 낯선 무언가를 보거나, 낯선 곳에서 익숙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 이곳저곳 방방곡곡을 노닐다.

/사진=김은혜 칼럼니스트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시절 사회시간에있었던 일이다. 선생님이 한창 한국의 지형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우리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셨다. "너희는 산이 좋니, 바다가 좋니?" 나는 멋쩍게 산이 좋다고 혼자 손을 들었다. 선생님은 이유를 물었고 나는 그때 "나무가 많아서요"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다. 몇 십 년이 지났지만 나의 취향은 그대로다. 여전히 산이 좋고 나무가 좋고, 그 나무가 이루고 있는 숲이 좋다.
지난 봄에는 숲을 찾아 무작정 전남 화순으로 떠났었다. 화순은 근처의 광주와 담양만큼 관광이나 방문으로 이름난 곳은 아니기에 더욱 매력적이기도 했다. 화순에는 적벽부터 시작해서 운주사, 고인돌 등 볼거리가 많지만 나의 목적은 숲이었기에 숲정이 마을을 찾아 길을 나섰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상아색의 낡은 건물에 또박또박 쓰인 화순터미널이라는 검은 글씨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조용한 군내를 천천히 거닐다 시장입구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어가 애호박국 한 그릇을 먹고 동북면 연둔리 둔동 마을에 있는 숲정이로 향했다.

숲정이라는 말은 마을 근처 숲을 가리키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둔동마을 옆에는 동북천이 흐르는데, 1500년대에 마을이 형성되고 나서 여름철 홍수를 막기 위해 나무를 심으면서 생겨났다고 한다. 내천 옆에 700미터 정도 이어진 숲길이 바로 숲정이다. 마을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조용했다. 저 멀리 다리 건너 초록빛으로 이어진 길이 보였다. 나는 서두를 것 없이 천천히 작은 다리를 건너 숲정이로 향했다.
숲정이는 유명한 휴양림마냥 시끄럽지 않았다. 몇몇의 사람들만이 앉아서 혹은 걸으면서 풍광을 즐기고 있었다. 중간 중간에 놓인 의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작은 배려로 느껴졌다. 의자에 앉아보니 동북천의 맑은 물에 숲정이의 모습과 맑은 하늘이 그대로 비추어 보인다. 몇 백 년이 된 나무에서 새로이 자라난 연두색 여린 잎들이 흔들리는 모습도 그대로 물 위에 담긴다. 숲정이는 소소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고요하고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최적의 장소였다.
숲길을 다시 돌아 뒤쪽에 있는 마을로 향해본다. 강아지와 길고양이, 그리고 밭일을 하러 가는 모녀를 지나쳐 마을의 큰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잠시 앉아 휴식을 취했다. 그러던 찰나 한 할머니께서 대문을 열고 내 곁에 앉으신다. 뭐 볼 게 있어서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왔냐고 여쭤보신다. '여기 숲정이를 보러 왔어요'라고 대답하려던 찰나 할머니께서는 "조용하게 편히 쉬다가 가라"며 웃으면서 말씀해주신다. 숲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숲 안에서 쉬러 온 것은 어떻게 아셨는지. 나 역시 웃으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사진=김은혜 칼럼니스트
작년 한 해는 유난히 몸도 마음도 아픈 날이 많아 숲을 자주 그리워했다. 그중에서도 봄과 여름의 숲을 자주 머릿속에 그렸다. 온통 초록빛으로 드리워져 다른 세상에 와 있듯 녹음(綠陰)이 우거진 그런 숲 말이다. 그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나무 사이로 보이는 하늘도 오롯이 내 것같이 느껴진다. 나무 이파리들이 겹쳐져 여러 명암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들여다보는 일은 마음속의 복잡한 생각을 잊게 만든다. 겨울이 되면 이런 '숲 치유법'을 누릴 수가 없으니 더욱이 숲이 그립다. 얼른 겨울이 지나 봄이 왔으면, 봄이 되어 다시 초록빛의 숲을 볼 수 있었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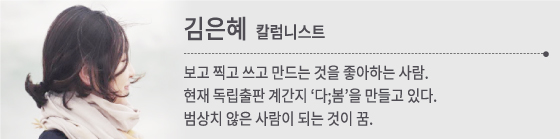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김혜자, 데뷔 64년 만에 '최초'로 화장품 모델 발탁](https://thumb.mt.co.kr/06/2025/04/2025041709565316298_1.jpg/dims/resize/300x/optimize/)
![[영상]택배 상자 속에 잘린 손이](https://thumb.mt.co.kr/06/2025/04/2025041614271091877_1.jpg/dims/resize/300x/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