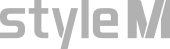재개발 대신 지켜야 할 그 곳…항구도시 목포 거리
Style M | 2016.01.26 09:01 | 조회 1577
[김은혜의 노닐다-6] 울고 웃던 그 추억들이 눈처럼 조용히 쌓인 곳, 목포를 가다
익숙했던 것들에서 낯선 무언가를 보거나, 낯선 곳에서 익숙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 이곳저곳 방방곡곡을 노닐다.

유행가의 제목처럼 '목포는 항구'이다. 여느 날보다 눈이 많이 내린 목포는 항구도시라 그런지 눈과 함께 부둣가의 많은 곳이 '쉼표 상태'였다. 서해의 많은 섬으로 향하는 출발지인 목포 여객선 터미널의 대합실도 텅 비었다. 운행 전면 통제, 풍랑주의보라는 붉은 글씨만이 전광판을 밝히고 있었다. 낯선 곳에서 이러한 뜻밖의 기상악화나 인적 없는 기운을 느끼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증폭되기 마련이지만, 이상하게 이곳에서는 마음이 평온했다.
나는 고요히 내리는 눈과 함께 고요한 목포의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사진=김은혜 칼럼니스트내가 걷고 있는 곳은 이른바 목포의 구도심이었다. 목포 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부둣가 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르게 뻗은 큰 길이 있다. 저 멀리 높게 지어진 목포근대역사관(과거 일본 영사관 건물)이 정중앙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이는 그런 길이다.
/사진=김은혜 칼럼니스트내가 걷고 있는 곳은 이른바 목포의 구도심이었다. 목포 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부둣가 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르게 뻗은 큰 길이 있다. 저 멀리 높게 지어진 목포근대역사관(과거 일본 영사관 건물)이 정중앙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이는 그런 길이다. 국내외 어디를 가든 가기 전에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그 지역의 오래된 곳, 즉 원도심이 어딘지 찾아보는 것인데 이번 목포에선 눈 내리는 풍경에 휩쓸려 아무 생각 없이 노닐다 보니 운 좋게 원하던 곳을 찾은 셈이다.
더군다나 목포는 부산, 인천, 군산과 같이 일제강점기 시절 개항된 지역이기에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구도심'의 풍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목포의 경우 1897년 개항이 되어 도시로 급속히 성장했다. 더불어 1914년에는 호남선 철도도 개통이 되면서 경제 호황기를 누리기도 했다. 식민지의 잔재인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 역시 내가 걸었던 목포의 중앙동에 아직까지 남아있었다. 항구를 벗어나 마을 쪽을 향해 걷다 보니 어느새 바다 내음이 가시고 아픔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동네들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온다.
 /사진=김은혜 칼럼니스트멀리서 보이던 일본 영사관 건물 위로 올라가 다시 걸어온 길을 바라보니 파노라마처럼 인근 지역의 생김새가 그대로 눈에 들어온다. 목포의 원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탁 트인 느낌도 들었지만 내가 서 있는 곳의 이 시선이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엔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눈발은 점점 더 거세졌다. 노적봉 예술공원까지만 잠시 올랐다가 다시 동네 쪽을 노닐기로 한다.
/사진=김은혜 칼럼니스트멀리서 보이던 일본 영사관 건물 위로 올라가 다시 걸어온 길을 바라보니 파노라마처럼 인근 지역의 생김새가 그대로 눈에 들어온다. 목포의 원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탁 트인 느낌도 들었지만 내가 서 있는 곳의 이 시선이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엔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눈발은 점점 더 거세졌다. 노적봉 예술공원까지만 잠시 올랐다가 다시 동네 쪽을 노닐기로 한다. 중앙으로 뻗은 큰 길 대신 좁게 이어진 작은 골목길들을 걸어본다. 시간이 멈춘 듯 웃음 짓게 하는 옛 풍경들이 곳곳에 흩어져있다. 작은 세탁소, 낡은 비디오 가게, 슈퍼 앞 평상에 앉은 동네 어르신 3인방, 골목 입구에 남아있는 공중전화기, 동네 학생들을 위해 있었을 것 같은 오락실 등 목포 사람들의 희로애락의 역사가 그득히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진=김은혜 칼럼니스트매우 가파른 속도로 발전해 온 대한민국의 특성상 어느 지역이든 한 번 이상은 이른바 '번화가'라고 불리는 곳이 옮겨지곤 한다. 목포 역시 지금은 영산강호와 평화광장이 있는 신도심이 존재하기도 한다. 구도심이라면 흔히 낡은 곳, 한때 지역민들의 발길이 잦았던 곳, 재개발되어야 하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시각에서 벗어나 '지켜야 할 곳', '다시 불씨를 살려야 할 곳'으로 보는 시선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사진=김은혜 칼럼니스트매우 가파른 속도로 발전해 온 대한민국의 특성상 어느 지역이든 한 번 이상은 이른바 '번화가'라고 불리는 곳이 옮겨지곤 한다. 목포 역시 지금은 영산강호와 평화광장이 있는 신도심이 존재하기도 한다. 구도심이라면 흔히 낡은 곳, 한때 지역민들의 발길이 잦았던 곳, 재개발되어야 하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시각에서 벗어나 '지켜야 할 곳', '다시 불씨를 살려야 할 곳'으로 보는 시선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낡은 곳을 새로운 곳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오래된 건물과 도로를 허무는 것은 오랜 시간 켜켜이 쌓여 온 '사람의 역사'를 허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저 조용히 내려 쌓이는 이 눈처럼, 목포의 울고 웃던 그 추억들이 조용히 쌓였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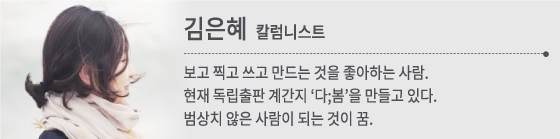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단독] 김혜자, 데뷔 64년 만에 '최초'로 화장품 모델 발탁](https://thumb.mt.co.kr/06/2025/04/2025041709565316298_1.jpg/dims/resize/300x/optimize/)
![[영상]택배 상자 속에 잘린 손이](https://thumb.mt.co.kr/06/2025/04/2025041614271091877_1.jpg/dims/resize/300x/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