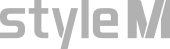일제강점기 두 마을의 사연 깃든 마지막 민자역사
[김은혜의 노닐다-9] 봉화·울진 원곡마을 주민의 마음 담긴 '양원역'에 가다
익숙했던 것들에서 낯선 무언가를 보거나 낯선 곳에서 익숙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 여기저기 방방곡곡을 노닐다.

/사진제공=김은혜 칼럼니스트
최근 인터넷에서 일본의 한 간이역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오로지 단 한 명의 여학생을 위해 존재한 그런 간이역이었다. 그 역은 여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나서야 제 임무를 다한 듯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순간,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사연을 가진 간이역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그래서 찾아가게 된 곳이 바로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양원역'이다.
서울에서 양원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종류의 기차를 타야한다. 바로 'O-train'이라 불리는 중부내륙순환열차다. 1호선을 기다리다보면 이따금씩 형형색색으로 꾸며진 특이한 모양의 기차를 보곤 했는데 O-train도 그 중 하나다. O-train은 중부내륙권인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상북도를 거친 백두대간의 자연을 끼고 도는 기차라 할 수 있다. 서울에서 출발해 오송, 충주, 제천, 단양, 영주, 봉화, 철암 등을 거친다.
이 열차의 가장 큰 장점은 승객들로 하여금 다섯시간의 긴 기차여행을 무료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내부의 디자인이나 음악은 다소 산만하지만 승무원이 위트있게 진행하는 나름의 라디오 이벤트는 객실 내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가족 혹은 연인, 친구들과 떠나온 이들은 각자의 사연과 듣고 싶은 곡을 적어 사람들과 공유한다. 그러는 사이, 열차는 군소리 없이 대한민국의 산길을 묵묵히 오르고 오른다. 모니터로 보이는 기차의 시선에서 왠지 모를 우직함까지 느껴진다.
 /사진제공=김은혜 칼럼니스트
/사진제공=김은혜 칼럼니스트
기차는 한참을 달리고 달리다가 영주역에서 조금 오래 머문다. 중앙선을 달리던 기차가 영동선으로 노선을 바꾸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가 익숙한 한 아주머니께서 "지금부터는 아까와 반대로 가니 의자를 돌려서 앉아라"고 귀띔해주신다. 그렇게 잠시 멈춰섰던 기차는 영주역을 지나 다시 달렸다. 양원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춘양역, 분천역 등 몇 군데의 간이역을 거쳐야한다. 분천역의 경우 스위스의 한 역과 협약을 맺어 스위스풍의 역사로 재탄생했다하여 산타마을로 불리웠다. 기차에 내린 사람들은 역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며 각자의 추억을 남겼다. 양원역에도 거의 다 다다랐다.
양원역의 이름은 일제강점기 시절 낙동강 물줄기를 기준으로 나뉜 봉화 원곡마을과 울진 원곡마을, 즉 양쪽의 원곡마을이란 뜻으로 만들어졌다. 오로지 재를 넘어야 외부로 나갈 수 있었던 주민들의 고충과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역이 바로 양원역이다.

/사진제공=김은혜 칼럼니스트
O-train의 노선을 거의 다 돌았을 때쯤 기관사가 양원역에 다왔다고 직접 알려줬다. 세상에, 이렇게 소박하고 작은 역이 또 있을까. 또박또박 쓰여진 양원역 대합실엔 오래된 벤치와 낡은 구형 텔레비전만이 놓여 있었다. 대합실 한쪽에는 '사노라면'이라는 시가 걸려있는데 놀랍게도 주민이 직접 쓴 시였다. 그 시의 주인공을 우연히 역에서 만났다. 그는 나고 자란 이곳 경북 봉화군 소천군 분천리 원곡마을에 대한 마음을 담아 썼다고 내게 직접 설명해줬다.
산이좋아
이곳에 있었노라
물이좋아
이곳에 머물렀노라
화전밭 일구면서
살아온 세월 어젠데...
한평생 산따라 강따라
풀메기 등에메고 거릴며
사노라고...(후략)

/사진제공=김은혜 칼럼니스트
대합실을 나오자 외지인의 손길이 묻지 않은 정화수같은 깨끗한 풍경이 양원역을 둘러싸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낙동강 상류의 물줄기는 흰옷이 녹아 물 흐르는 소리를 아득히 내고 있었다. 바람도 더이상 날카롭게 느껴지지 않는 초봄의 바람이었다. 양원역이 처음 들어오던 1980년대의 어느날도 이런 산뜻하고 기분좋은 느낌이었을까. 힘들게 재를 넘고 위험하게 기찻길을 건너던 과거 대신 힘차고 우직한 경적 소리를 뿜어내며 오늘도 양원역은 이곳 주민들의 두 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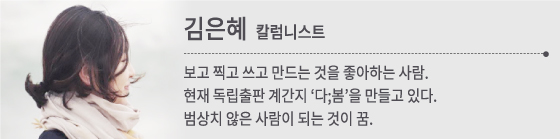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김혜자, 데뷔 64년 만에 '최초'로 화장품 모델 발탁](https://thumb.mt.co.kr/06/2025/04/2025041709565316298_1.jpg/dims/resize/300x/optimize/)
![[영상]택배 상자 속에 잘린 손이](https://thumb.mt.co.kr/06/2025/04/2025041614271091877_1.jpg/dims/resize/300x/optimize/)